고종 가계도 조선 제26대 왕 고종황제의 대한제국과 3.1운동의 도화선 고종 장례식
1863년 겨울, 조선 왕실은 위기 속에 새로운 국왕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후사 없이 승하한 철종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자는 누구인가? 왕실 내부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택된 이는 한때 왕족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이명복(훗날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의 즉위는 곧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정치적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즉위 당시 겨우 12세였던 고종은 실질적인 통치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는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명분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서원을 철폐하며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또한 쇄국 정책을 통해 서구 열강의 침투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강경책은 점점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개화파와 외척 세력들은 흥선대원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3년 고종은 친정을 선포하며 아버지를 권좌에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고종의 독자적인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권력자 명성황후 민 씨의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개화와 보수, 외세의 압박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지만 이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실 내부에서는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 씨 척족 세력이 급부상했고 이들과 개화파 및 수구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조선 사회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점차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1876년)을 시작으로 조선은 점진적인 개항의 길을 걸었고 이는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 확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개화 정책은 내부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은 이러한 내부 갈등의 산물이었고 조선 사회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자주권을 지키려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외세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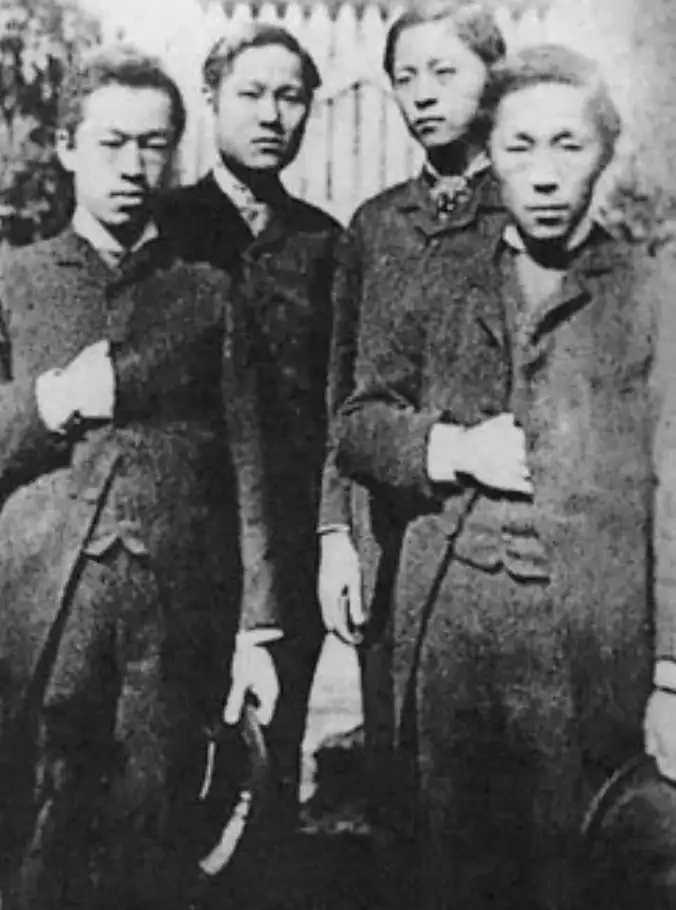
특히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패권을 다투면서 고종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청일전쟁(1884~1885)의 무대가 되었고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급속히 일본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95년 일본은 왕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감행했습니다.
고종은 이에 큰 충격을 받고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1896년)을 결행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탄생과 몰락
1897년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자주적인 독립국가임을 천명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며 군제 개혁, 철도 건설, 상공업 육성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한 후, 대한제국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오히려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에게 강제로 퇴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1907년 고종은 일제의 압력에 의해 퇴위하고 그의 아들 순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운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황제, 그리고 죽음

고종은 퇴위 이후 '태황제'라는 명목상 칭호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시받는 처지였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굴욕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덕수궁 함녕전에서 궁녀가 건넨 식혜를 마신 후에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지병인 뇌일혈 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고종의 죽음은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곧 3.1 운동으로 폭발했습니다.
3월 1일 수많은 조신인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쳤고 이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 고종, 무능한 왕이었을까?
고종을 평가하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편에서는 그를 무능한 군주로 봅니다.
고종은 왕위에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정치적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대원군과 명성황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며 국운을 기울게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고종은 시대의 희생양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9세기 초는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제국주의의 거센 파도에 휩쓸리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이미 외세의 각축장이 되어있었고 고종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더라도 이를 막아낼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점, 끝까지 일본에 저항하려 했던 모습은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종의 가계도
| 관계 | 이름 | 생몰년도 | 비고 |
| 조부 | 남연군 이구 | 1788~1836 | 사도세자의 서자 은언군의 아들 |
| 조모 | 용성부대부인 염씨 | 1793~1834 | 남연군의 부인 |
| 부 | 흥선대원군 이하응 | 1820~1898 | 조선의 실권자, 섭정 |
| 모 | 여흥부대부인 | 1818~1898 | 명성황후와 같은 여흥 민씨 가문 |
| 왕비(정비) | 명성황후 민씨 | 1851~1895 | 을미사변 |
| 계비 | 순헌황귀비 엄씨 | 1854~1911 | 영친왕의 생모 |
| 왕자 | 순종 이척 | 1874~1926 | 대한제국 제2대 황제 |
| 왕자 | 의친왕 이강 | 1877~1955 | 대한제국 황족, 독립운동 지원 |
| 왕자 | 영친왕 이은 | 1897~1970 | 일본에 볼모로 감 |
| 왕녀 | 덕혜옹주 | 1912~1989 | 대한제국 마지막 옹주 |
| 왕녀 | 이문용 | ?~? | 조기 사망 |
| 손자 | 이구 | 1931~2005 | 대한제국 마지막 황손 |
댓글